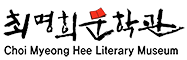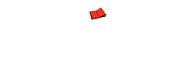나들목
그리고 최명희
최명희 씨를 생각함
최명희씨를 생각하면 작가의 어떤 근원적인 고독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1993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중국 연길 서시장을 구경하고 있다가 중국인 옷으로 변장하고 커다란 취재 노트를 든 최명희씨를 우연히 만났다.
「혼불」의 주인공의 행로를 따라 이제 막 거기까지 왔는데 며칠 후엔 심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연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너무 바가지를 씌우는 바람에 그런 옷을 입었노라고 했다. 그날 저녁 김학철 선생 댁엘 들르기로 되어 있어 같이 갔는데 깐깐한 선생께서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어찌나 통박을 주던지 민망해한 적이 있다. 그 후 서울에서 한 번 더 만났다. 한길사가 있던 신사동 어느 카페였는데 고저회와 함께 셋이서 이슥토록 맥주를 마신 것 같다. 밤이 늦어 방향이 같은 그와 함께 택시를 탔을 때였다. 도곡동 아파트가 가까워지자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울먹였다.’이형, 요즈음 내가 한 달에 얼마로 사는지 알아? 삼만 원이야, 삼만 원……


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모두 거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어?’ 고향 친구랍시고 겨우 내 손을 잡고 통곡하는 그를 달래느라 나는 그날 치른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몽땅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를 내게 했는지를. 그러자 그만 내 가슴도 마구 미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혼불’은 말하자면 그 하기 힘든 얘기의 긴 부분일 것이라고.
시집 ‘은빛 호각’ (이시형/창비) 중에서
▣ 작가 최명희와 소설 <혼불>을 떠올린 아름다운 분들의 애틋한 글이에요.
[전북대신문 사설 20181017]20주기 최명희를 생각하는 10월
출처: 전북대신문 1486호] 2018년 10월 17일 (수) 사설
https://www.jbpresscenter.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8
고(故) 최명희 작가가 타계한 지 어느새 20년이 됐다. 우리 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우리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최명희 작가는 우리 대학에서 제공한 묘역에 묻혀 있으니 지금도 전북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인물이다. 인문대학 내에는 ‘최명희홀’이 있고 우리 신문에서 주최하는 ‘최명희청년문학상’ 그리고 우리 대학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혼불문학상’까지…. 어쩌면 작가는 사후에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도 될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거명되는 한, 최명희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작가 최명희가 이와 같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그녀 필생의 역작 ‘혼불’이 준 감동이 작가에 대한 추모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현대문학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거장들이 모두 사후에 이와 같이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우 빠른 속도로 작가도 작품도 화석화되는 게 일반적이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학관이 많은 편인데 그 문학관의 정신적 주인들인 작가들을 떠올려 보면 어느새 문학사의 한 페이지로 깊이 안장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그렇다면 작가의 삶에 대한 존중과 애도의 마음이 최명희를 오래 떠올리게 하는 것인가? 평생 ‘혼불’에만 매달린 작가 최명희의 문학혼과 문학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뒀던 작가의 태도는 아닌 게 아니라 경탄스럽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최명희 작가보다 훨씬 더 신산스러운 삶을 살았던 작가들도 많고, 문학혼을 불태워 생명의 불꽃을 일찍 소진한 작가들도 적지 않다.
즉, 작가와 작품 양 측면 모두에서 최명희는 존중받고 추모의 대상이 될 만큼 가치 있는 작가임에 분명하지만 독보적이거나 유일한 작가는 아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취를 이룬 많은 작가들과 견줘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전혀 문학적인 접근도 아니다.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작가 최명희가 이와 같이 사후에도 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대학 구성원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은 최명희를 자랑스러운 동문(도민)으로 생각한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수많은 졸업생을 배출했고 그중에는 자랑스러운 인물들도 많다. 그중 누구를 우리의 으뜸 자랑으로 삼을 것인가? 한 집단의 정체성은 그렇게 드러난다.
선비의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이 있고, 예인의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이 있는가 하면, 불의에 대한 항거의 정신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지역도 있다. 그건 그 지역 사람들의 선택이며 동시에 집단적인 가치 표출 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대학(확장하면 우리 지역)은 문학(인)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 스스로 헌신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살다간 작가 최명희를 사회적 명망가보다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학이 전북대학교라는 것!
이런 점에서 작고한 지 20년이 지난 최명희 작가를 지금껏 생생하게 존재하게 만든 것은 우리들의 관심과 자부심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이 판소리의 본향이 되었던 이유는 그 어느 곳보다 ‘귀 명창’임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한 판소리 애청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년 우리 대학은 ‘최명희’를 통해 스스로 우리가 문학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전통이 자랑스럽다고 여겨진다면 이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독서의 계절 10월, 우리 모두의 손에 책 한 권씩 쥐어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86 |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국회의원 인터뷰
최명희문학관
|
2020.07.14
|
추천 0
|
조회 1115
|
최명희문학관 | 2020.07.14 | 0 | 1115 |
| 85 |
[경향신문 20200630] [김언호가 만난 시대정신의 현인들](14)“대화는 우리를 편견에서 해방시켜”…직언으로 조정·화해 이끌다
최명희문학관
|
2020.07.03
|
추천 0
|
조회 884
|
최명희문학관 | 2020.07.03 | 0 | 884 |
| 84 |
[전북일보 20200420] (칼럼)다시 손으로 씁니다
최명희문학관
|
2020.04.21
|
추천 0
|
조회 994
|
최명희문학관 | 2020.04.21 | 0 | 994 |
| 83 |
(김언호)‘혼불’처럼…어둠에서 밝음을 찾아낸 그의 문학은 그리움이다
최명희문학관
|
2020.02.26
|
추천 0
|
조회 1082
|
최명희문학관 | 2020.02.26 | 0 | 1082 |
| 82 |
(황선우)백일홍 단상(斷想)
최명희문학관
|
2019.08.25
|
추천 0
|
조회 1140
|
최명희문학관 | 2019.08.25 | 0 | 1140 |
| 81 |
(이승하) 소설가의 길-이시영의 '최명희 씨를 생각함'
최명희문학관
|
2019.06.29
|
추천 0
|
조회 1392
|
최명희문학관 | 2019.06.29 | 0 | 1392 |
| 80 |
(강원일보)우편물 대란 걱정
최명희문학관
|
2019.06.29
|
추천 0
|
조회 1235
|
최명희문학관 | 2019.06.29 | 0 | 1235 |
| 79 |
(김두규) 풍수론 따르지 않은 종택 공간 배치… 천왕봉 전경을 살렸다
최명희문학관
|
2019.06.29
|
추천 0
|
조회 1353
|
최명희문학관 | 2019.06.29 | 0 | 1353 |
| 78 |
최명희 선생님, 시, 그리고 샹송
최명희문학관
|
2019.05.27
|
추천 0
|
조회 1205
|
최명희문학관 | 2019.05.27 | 0 | 1205 |
| 77 |
황선열 박사 ‘우리 시대의 언어, 소통과 불통’
최명희문학관
|
2019.05.01
|
추천 0
|
조회 1388
|
최명희문학관 | 2019.05.01 | 0 | 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