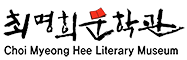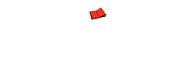아소, 님하
수필
작품의 저작권은 작가(또는 유족)에게 있으며 학문연구 이외의 사용은 저작권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영리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체부_최명희
가까워지던 목소리가 나를 부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때는 그만 가슴이 텅 비어 버리고, 뛰쳐나가 그의 가방을 뒤져 보고 싶은 충동을 받곤 한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고독해져 간다고 들었다. 확실히 메카니즘의 금속성이 신경을 자극하는 요즘, 우리는 서로에게서 격리되고 고립되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많은 기계들의 소리, 사람의 손보다 더 위력 있는 기계들의 손, 사람의 목숨보다 더 모진 기계들의 수명…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 가고, 체온을 망각해 가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체부의 음성은 가장 정겨운 인간의 소리로 우리에게 부딪쳐 오는 것이다. 그의 소리가 항상 따뜻한 것만은 아니어서 사납고 왁살스럽게 들릴 때도 있지만, 조금도 싫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우체부, 그의 모든 것은 살아 있는 낭만이다. 그의 모자와 옷과 운동화의 빛깔들…… 그의 전신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무한한 그리움이다. 그의 낡은 가죽 가방은 시다. 흘러넘칠 만큼 배부른 사연들을, 때로는 헐렁헐렁하게 흔들리는 몇 통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큼직한 가방에는 어떤 기다림과 동경과 바램이 흠뻑 배어 있다.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분홍빛 얘기, 썰렁한 절연장, 그리고 검은 빛의 부고며, 5급 공무원 합격 통지서, 고위층의 파아티 초대장에서부터 후생 주택 연부금 독촉장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손길과 대화들이 서로 부딪고 뒹구는 그 가방 안이야말로 가장 푸짐한 인간의 호흡이요, 숱한 생명의 축소된 역사이다. 나는 항상 우체부를 좋아한다. 그가 충실하고 정직한 직업인이기 때문일까? 그러나 나는 그에게 “직업인”이라는 렛델을 붙이고 싶지는 않다. 그는 현실적인 생활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영원한 동화의 아저씨로 내 마음에 남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는 주는 사람이다. 우체부 자신이 원해서였든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든지, 그는 가장 평화로운 자세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져다준다. 나는 그가 주는 흐뭇하고 서민적인 평화를 좋아한다. 그가 나를 부르는 소리, 그의 가방 빛깔, 그리고 내게로 오는 그의 발자국들은 내 허허로운 영역에 훈훈한 꽃잎을 나누어 준다. 나는 “보랏빛 우체부”가 되고 싶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해에는 전국남녀고교 문예콩쿠르에서 수필 <우체부> 가 장원으로 뽑혀 학생의 작품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시 고등학교 작문교과서 (박목월 – 전태규 공저, 정음사판)에 실렸다.
그대 그리운이여_최명희
언제라고 강물이 한자리에 서 있으랴만, 가을의 강물은 뒷모습을 차갑게 가라앉히며 멀리 떠나가는 강물이요, 겨울 강물은 쓸쓸히 남은 그 물의 살을 벗고, 오직 뼈만으로 허옇게 얼어붙어 극한(極寒) 속에서 존재의 막투름을 견디는 얼음이다. 지난 여름, 무성하게 푸르러 눈부시게 젊고도 풍요로운 강물이 제 온몸을 수천 수만 수십만 개 은비늘로 찬연히 부수며, 물의 살 끝 끝에까지 차오르던 환희를 어찌잊으리. 목숨이 누리는 영화에 여한이 없었다. 흰 돛 달고 두둥실 구름같이 배 띄우는 수면에 바람은 불어와 황금빛 노를 젓는데, 솟구쳐 뛰노는 은어떼, 비단고기, 자멱질이 숨 막히었지. 이윽고 해가 지면 밤이 익어 꽃술 터지듯 함성을 지르며 쏟아지던 저 별들의 무리. 살아서 아름다워, 이만한 충만이 어디 있으랴. … 중략 …
허울과 애착을 다 벗은 조그만 씨앗이 되어_최명희
뒤안 마당 감나무 아래 앉아 소꼽 놀던 사금파리 꽃접시며, 깨진 조갑지를 곱게 갈아 흙밥도 담고 싱건지 국물도 떠 놓던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그 빛깔이 하도 선명하고 예뻐서 만지기조차 아깝던 색색갈 색종이들의 노랑, 빨강, 남색, 초록, 보라, 주황. 설레이며 그 빛깔들을 접고 오려서 저고리치마에 레이스 달린 원피스 입혀준 중이인형들. 쓰다가 더 못쓰게 된 몽당연필들과 닳아진 지우개, 귀퉁이가 꺾인 책받침, 낡은 필통. 서투르게 한 자 한 자 꼭꼭 눌러 쓴 국어 공책, 방학숙제 일기장과, 참 잘 썼어요, 라고 적힌 선생님의 붉은 잉크 날렵한 펜글씨. 우리들의 우정은 변치 말자, 아쉬운 국민학교 졸업을 앞두고 굳은 맹세를 나눈 친구의 쪽지 한 장. 그런 것들은 중학교에 진학을 하고서도 버려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늘어나게 된 갖가지 살림살이들 때문에 서랍이 비좁아 상자를 몇 개씩이나 더 가지게 되었으니.
… <중략> …
La Belle 1991.9 p232-235 (중앙일보에서 나온 하이틴 잡지)
계절과 먼지들_최명희
밤이 깊다. 밤에는 쉬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끊임없는 울음으로 사슬을 메고 가는 것 같은 幻覺에 가슴이 저려 온다.
밤은, 밤은 그냥 좋은 것이었다.
삐쩍 마른 自我를 끌고 밤까지 오면 나는 얼마나 피로한 우울에 빠져 들었는가, 그냥 늪에 잠겨 버리고픈 그런.
二月 十七日
人間에게 <말> 이 있다는 건 얼마나 견딜 수 없도록 지겨운 일인가 ―.
말, 말들, 그 수많은 말(言語)들.
귀가 찢어지고, 고막이 터져 귀 먹을 것 같은 그 말 소리들.
입들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그 아무 필요성 없는 온갖 이야기들에 혹사되는 말, 말, 그 말, 공포로운―. 이제는 쓰일대로 쓰여 져 낡아버린 말들, 헌 걸레쪽처럼 발길에 채이고
… 중략 …
영생대학보 14호 68.5.16에 실려있다
오후_최명희
나는 섬유질처럼 질긴 그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돌려 어느곳에서 아이가 울고 있는가 찾기 시작했다.
도대체 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방향조차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어느 골목을 따라 한참동안 헤매다가 들판같이 휑한 공지(空地)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모랫더미가 무덤처럼 널려있고 그것들은 오후의 햇빛에 되쏘여 거울가루와 같았다.
어디서 아이가 울까.
이런 삭막하고 텅 빈 곳에 어린 아이가 있을리 없는데.
쏟아지는 햇빛을 손으로 가리며 울음 소리가 나는 곳을 찾노라고 두리번거리다가 온통 하얗게 바랜 채 다른 빛도 소리도 없는 어느 커다란 모랫더미 위에서 여섯달도 채 못되었을 어린 아이가 손등으로 눈을 부비며 어깨를 들먹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얼굴과 머릿속, 목, 팔, 다리 할 것 없이 온통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된 채 주저앉아 흡사 한없이 지루하고 무더운 여름 밤마루 위에 잠 든 어린 아이가 끊임없이 달려들어 물어대는 모기에 지치고 겨워 우는 것처럼 훌쩍이고 있었다. 「아가, 왜 울어?」
… 중략 …
전북대학신문 지령 400호 기념 동문 문예 특집에 콩트 [오후]를 발표했다.
꽃잎처럼 흘러간 나의 노래들 나의 중3시절_최명희
「왜들 그렇게 태평 세월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은행나무 낙엽지듯 우수수 할 거야. 졸업반이 왜 그 모양이죠?」
최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은 와― 웃었다. 나는 유리창 밖으로 운동장을 내다 보았다.
프라타나스가 싱싱하게 펄럭였다. 그런데, 그 많은 잎사귀 사이로 한 잎이 빙글빙글 맴을 돌며 졌다.
나는 묘한 충격으로 골이 띠잉 했다.
칠월에 낙엽이 지다니―.
남들은 그 푸른 생명으로 힘찬 여름 한나절에 왜 그 잎은 시들어 갔을까. 왜 채 물들지 않은 철 이른 게절에 혼자만 이름없이 죽어 갔을까….
「자살(自殺)했어. 나뭇잎이 자살한 거야.」
「왜 그랬을까?」
「외로우니까―.」 제법 심각한 정의 말에 나도 고개를 그덕이고 말았다.
7月의 落葉.
생각해 보면 철학이란 사소한 곳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정희는 그 낙엽을 <자연의 궤도를 이탈한 문제아> 란다.
1962年 12月19日
온통 교실이 크라스마스 캐럴과 카드로 들떠 있었다.
얼마지 않으면 멀리들 서로 흘러가야 한다는 서글픔 때문일까? 종일 웅성거리며 맘 잡지 못하고 서성대는 것은―? 선생님이 종례 때 들고 오시는 카드 봉투는 거의 책 두께만큼 두꺼웠다. 그리고, 졸업 기념 싸인지를 들고 다니는 아이들의 걸음 걸이도 들떠 보이고, 온통 수런거린다. 울고 싶다.
옥이가 내게 <냉하> 란다.
… 중략 …
꽃 관_최명희
꽃모가지가 흔들리면서 새큰한 꽃향기가 햇빛 속으로 퍼졌다. 시계꽃 향기는 어쩌면 풀냄새도 같고 어쩌면 꽃냄새도 같다.
나는 스커트 위에 수북하게 뽑혀있는 꽃모가지들을 가지런히 챙기며 꽃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손등과 뒷목에 쪼이는 햇빛이 따갑다. 손을 놀릴 때마다 밀려 오는 바람에 흔들려 퍼지는 시계꽃 향기가 머릿속으로 가슴 속으로 소리를 내며 흘러든다. 만들던 꽃관을 뺨에 대본다. 가실가실한 감촉, 그보다 쿡 하고 숨이 막히게 찔려오는 꽃 냄새.
왜일까…………
꽃냄새가 향유처럼 몸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느끼며 문득, 커다란 여자인데도, 두 손등으로 눈을 가리우고 훌쩍거리고 싶어지던 슬픔은. 시계꽃 에는 나의 어린날이 그대로 묻어 있다.
시간은 쉬임없이 흘러가고, 그 날 위에 또 날이 흘러가지만, 내 나이 아직 어려서, 살빛이 투명하고 목소리도 맑던 때, 아무렇게나 팔목에 걸어 맨 꽃시계의 바늘은 아직도 그 자리에 향기를 뿜으며 머물러 있다.
갈색이 되어 시들어지면 풀어 내던지고 다시 새 꽃으로 갈아 맸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나이가 나보다 더 무거워져도, 시계꽃에 걸린 시간은 항시 그곳에 머물러 있다.
머리를 땋듯이 꽃을 땋아내리면서, 이만하면 알맞을까 하고 머리에 둘러 본다. 얼굴 위로, 꽃관에서 향기가 흘러내렸다. 향기는 온 얼굴을 적시우고 몸속으로 스며든다,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화려한 옛날인가. 내가 공주처럼 꽃관을 쓰고 은밀한 대관식을 올리던 것은.
… 중략 …
전주 기전여자중고등학교 교지 (기전 제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