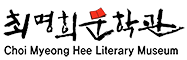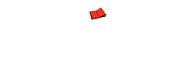나들목
그리고 최명희
최명희 씨를 생각함
최명희씨를 생각하면 작가의 어떤 근원적인 고독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1993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중국 연길 서시장을 구경하고 있다가 중국인 옷으로 변장하고 커다란 취재 노트를 든 최명희씨를 우연히 만났다.
「혼불」의 주인공의 행로를 따라 이제 막 거기까지 왔는데 며칠 후엔 심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연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너무 바가지를 씌우는 바람에 그런 옷을 입었노라고 했다. 그날 저녁 김학철 선생 댁엘 들르기로 되어 있어 같이 갔는데 깐깐한 선생께서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어찌나 통박을 주던지 민망해한 적이 있다. 그 후 서울에서 한 번 더 만났다. 한길사가 있던 신사동 어느 카페였는데 고저회와 함께 셋이서 이슥토록 맥주를 마신 것 같다. 밤이 늦어 방향이 같은 그와 함께 택시를 탔을 때였다. 도곡동 아파트가 가까워지자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울먹였다.’이형, 요즈음 내가 한 달에 얼마로 사는지 알아? 삼만 원이야, 삼만 원……


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모두 거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어?’ 고향 친구랍시고 겨우 내 손을 잡고 통곡하는 그를 달래느라 나는 그날 치른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몽땅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를 내게 했는지를. 그러자 그만 내 가슴도 마구 미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혼불’은 말하자면 그 하기 힘든 얘기의 긴 부분일 것이라고.
시집 ‘은빛 호각’ (이시형/창비) 중에서
▣ 작가 최명희와 소설 <혼불>을 떠올린 아름다운 분들의 애틋한 글이에요.
(노인봉)의 작가 최명희의 모국어 사랑
노인봉의 우리말 산책(23) -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모국어 사랑
| “그래서 사실 이 <혼불>을 통해서 단순한 흥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누천년(累千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면면(綿綿)이 이어져 내려온 우리 조상의 숨결과 삶의 모습과 언어와 기쁨과 슬픔을 발효(醱酵)시켜서 진정한 우리의 얼이, 넋이 무늬로 피어나는 그런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훼손되지 않은 순결한 우리의 모국어를 살려 보고 싶었습니다.” 앞의 글은 <혼불>을 쓴 소설가 최명희님이 1998년 6월 1일 호암상 시상식에서 한 답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 답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됩니다. “저에게 조국이 있고 모국어가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작가만큼 치열하게 우리말을 사랑한 사람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혼불>은 여러 면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 그 소설의 뛰어난 어휘 구사를 높이 평가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소설은 얘기 위주로 되어 있어 아름다운 우리말 때문에 끌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어사전 한 번 안 찾아보아도 읽을 수 있는, 너무나 평이한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혼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에도 사전을 찾지 않으면 모를 어휘가 몇 개씩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우리 모국어를 살찌우고 아름답게 하는 값진 보배들입니다. 한 예로 ‘아리잠직하다’를 볼까요? 모르시겠지요? ‘지견(知見)이 풍연(豊衍)하다’는 어떤가요? 모르시겠지요? 예를 들자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휘들이 쉽게쉽게 저절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작가의 피나는 노력의 소산(所産)이라는 건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1997년 11월 8일에 있었던 <최명희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직접 육성(肉聲)으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중 몇 예만 추려 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 강실이의 애련하고 안개처럼 자욱한 고운 모습을 싱겁게 ‘아름답다’다 ‘곱다’라고는 할 수 없어 계속 사전을 뒤지다 ‘아리짐작하다’를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이 낱말을 찾아내고선 사전이 얼마나 예쁘던지 막 쓰다듬어 주었다고도 하였습니다. 역시 주인공의 하나라 할 만한 청암 부인을 묘사하는 ‘지견이 풍연하다’의 경우도 ‘지식이 풍부하다’로는 도무지 마땅치 않아 사전에서 <知>자가 들어간 낱말을 다 뒤져 <知見>을 찾아내고, <豊>자가 들어간 낱말을 다 뒤져 <豊衍>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최명희님은 새 어휘를 개발해 쓴 것도 많습니다. 절에서 들리는 저녁 종소리를 <강 강>이라고 묘사한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중3 때 그렇게 들려 <혼불>에다 썼다는데 이건 그분의 창작이겠지요. 까치가 ‘까작까작’ 울었다든가, 꽃이 ‘봉울봉울’ 어우러졌다든가, 구름이 ‘나훌나훌’ 흘러갔다든가, 눈썹이 ‘쑤실쑤실’했다든가, 발을 ‘허펑지펑’ 딛는다든가 이런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소살소살’을 찾아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른 봄 얼었던 강이 풀리는 소리를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일부러 북한강을 찾아가 날이 저물 때 강가에 가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소살소살’이라고 들리더라는 겁니다. 어떤가요? 국어사전에 올라 있어도 누구 하나 써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어(死語)가 되고 말 테지요. ‘아리짐작하다’ 이런 아름다운 말이 죽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살리는 임무가 누구보다도 바로 작가의 임무일 것입니다. 최명희님은 그 임무를 누구보다도 충실히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살소살’이니 ‘강 강’이니 하는 말을 한 사람씩 써 나가면 우리말은 그만큼 더 풍부한 언어가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말을, 모국어를 풍부하게 가꾸어 가는 일도 물론 작가의 몫일 것입니다. 최명희님은 이 일도 놀랍도록 훌륭히 하였던 것입니다. 최명희, 참으로 특별한 분이었지요. 이제 그분의 어록(語錄) 몇 개를 더 보이며 이 글을 끝맺고자 합니다. “제가 여학교에서 만 9년간 국어 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국어를 가르치면서 모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선생이라는 게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을 느끼곤 했었어요.” “제가 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게 국어사전입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사전을 시집처럼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사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책상머리에는 항상 사전이 있죠. 그리고 그 사전을 저 자신이 시집처럼 읽습니다. 필요한 말을 찾으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한 날, 아니면 쓸쓸한 날 그냥 사전을 넘깁니다.” “저는 죽어서 다시 나도 여자로 나고 싶고, 죽어서 다시 나도 대한민국에 나고 싶고, 죽어서 다시 나도 전주에 나고 싶고 … 그냥 요대로 다시 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우리말이 좋아요. 그냥 마치 연인의 이름처럼, 그리운 고향처럼, 우리말이 주는 음향과 그 음향에서 오는 상상력 그런 게 진짜 좋아요.”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26 |
(노인봉)의 작가 최명희의 모국어 사랑
최명희문학관
|
2007.09.16
|
추천 0
|
조회 2930
|
최명희문학관 | 2007.09.16 | 0 | 2930 |
| 25 |
(김택근)최명희와 ‘혼불’
최명희문학관
|
2007.05.25
|
추천 0
|
조회 2431
|
최명희문학관 | 2007.05.25 | 0 | 2431 |
| 24 |
[정성희] ‘교사 최명희’의 추억
최명희문학관
|
2007.05.25
|
추천 0
|
조회 2736
|
최명희문학관 | 2007.05.25 | 0 | 2736 |
| 23 |
(김규남)전라도 말의 '꽃심'
최명희문학관
|
2007.04.11
|
추천 0
|
조회 3747
|
최명희문학관 | 2007.04.11 | 0 | 3747 |
| 22 |
(박용찬) 한글 파괴하는 외래어… 스카이라운지 대신 '하늘쉼터'로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추천 0
|
조회 2325
|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0 | 2325 |
| 21 |
(이태영) 문학 작품과 방언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추천 0
|
조회 3162
|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0 | 3162 |
| 20 |
(김영석) 박정만 시인과 최명희...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추천 0
|
조회 2205
|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0 | 2205 |
| 19 |
(최병옥)혼불일기
문학관지기
|
2007.02.01
|
추천 0
|
조회 2369
|
문학관지기 | 2007.02.01 | 0 | 2369 |
| 18 |
(동아일보) [혼불 독자의 밤]그녀는 갔지만 '혼불'은 타오른다
최명희문학관
|
2007.02.01
|
추천 0
|
조회 1930
|
최명희문학관 | 2007.02.01 | 0 | 1930 |
| 17 |
(김두규)불꽃 같은 삶 ‘초롱불’ 안식처
최명희문학관
|
2007.02.01
|
추천 0
|
조회 2079
|
최명희문학관 | 2007.02.01 | 0 | 2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