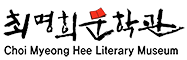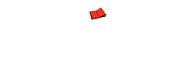나들목
그리고 최명희
최명희 씨를 생각함
최명희씨를 생각하면 작가의 어떤 근원적인 고독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1993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중국 연길 서시장을 구경하고 있다가 중국인 옷으로 변장하고 커다란 취재 노트를 든 최명희씨를 우연히 만났다.
「혼불」의 주인공의 행로를 따라 이제 막 거기까지 왔는데 며칠 후엔 심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연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너무 바가지를 씌우는 바람에 그런 옷을 입었노라고 했다. 그날 저녁 김학철 선생 댁엘 들르기로 되어 있어 같이 갔는데 깐깐한 선생께서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어찌나 통박을 주던지 민망해한 적이 있다. 그 후 서울에서 한 번 더 만났다. 한길사가 있던 신사동 어느 카페였는데 고저회와 함께 셋이서 이슥토록 맥주를 마신 것 같다. 밤이 늦어 방향이 같은 그와 함께 택시를 탔을 때였다. 도곡동 아파트가 가까워지자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울먹였다.’이형, 요즈음 내가 한 달에 얼마로 사는지 알아? 삼만 원이야, 삼만 원……


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모두 거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어?’ 고향 친구랍시고 겨우 내 손을 잡고 통곡하는 그를 달래느라 나는 그날 치른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몽땅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를 내게 했는지를. 그러자 그만 내 가슴도 마구 미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혼불’은 말하자면 그 하기 힘든 얘기의 긴 부분일 것이라고.
시집 ‘은빛 호각’ (이시형/창비) 중에서
▣ 작가 최명희와 소설 <혼불>을 떠올린 아름다운 분들의 애틋한 글이에요.
(김병종)풍악산 자락엔 그녀 '혼불'이 타오르고
풍악산 자락엔 그녀 '혼불'이 타오르고
간혹 그런 날이 있습니다. 한낮인데도 천지가 어두움에 싸이는 날. 구름은 음산하게 몰려다니고 짐승 같은 바람의 울음이 거리를 핥고 가는 날.
시간의 불연속선 속에서 밤과 낮이 뒤집혀 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날이. 98년 가을의 어느 날, 광화문에서 마지막으로 작가 최명희를 만나던 날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라는 것은 그녀와 같은 신문의 신춘문예 시상식장에서 처음 만난 뒤 고즈넉한 우의를 나누어 온 세월이 어언 20여 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5, 6년 연상이었지만 예(예)를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병이 깊어 일체 외부 연락을 끊어 버린 지 실로 일 년 만의 외출이었습니다. 모처럼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거의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간혹 내 어깨 뒤로 창 밖을 할퀴는 사나운 바람을 바라 볼 뿐이었습니다.
식사 후 예전에 그녀가 잘 갔다는 압구정동의 한 찻집으로 갔습니다. 텅 빈 그곳에서는 에디트 피아프의 쉰 목소리가 혼자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커피만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으로의 ‘혼불’의 계획에 대해 나는 신문기자처럼 물었고 그녀는 몇 가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노래가 레오페레인가로 바뀌었을 무렵 우리는 일어섰고 내가 차 값을 냈습니다. 그녀는 잠시 낭패한 듯한 표정으로 있다가 “이담엔 내가 꼭 살게요.” 라고 했습니다. “이담에 언제요?”라고 했더니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겨울 되기 전? 아니 내년 봄쯤일지도 몰라. 걱정마요. 꼭 살게요.”
찻집을 나오는데 샹송 가수의 노랫말이 명주 고름처럼 발에 감기웠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과 함께 모든 것은 가버린다네…… 가버린다네 모든 것이 시간과 함께……
그 두 달 뒤 최명희의 부음을 받았습니다. 싸르락 싸르락 눈발이 날리던 저녁이었습니다. 수화기의 저편에서 건조한 목소리 하나가 날보고 조사를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유난히 깔끔하고 결벽증적이었던 그녀는 그만 내게 했던 차 한잔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죽음의 길 떠나는 이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듯이 가는 것이지만, 그녀 또한 차갑고 단호하게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소신공양(소신공양)하듯 17년 세월동안 ‘혼불’ 열 권을 쓰고 종생(종생)에 이른 것입니다.
생전에 그녀는 유난히 고구려 벽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니 벽화를 그린 이름 없는 화공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오직 바위와 대화하고 그 바위 위에 혼을 새겨 넣는 화공에게 자신을 투영시킨 듯 했습니다. 혼불 1권을 쓰고 났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내 작업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쩌면 신문에 월평 하나 써주는 사람 없죠?” 평론가들 말이었습니다. 나는 위로랍시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래 벽화를 그린 화공을 닮으시려던 것 아니었던가요. 화공을 알아주는 사람 없었건만 벽화는 아직도 살아 빛을 발하지 않나요? 걱정마세요. 혼불도 그럴 겁니다.” 라고.
혼불이 세 권 째 나오고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이제 평론가를 바라보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아요. 오늘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혼불을 읽고 읽는데 하마터면 울 뻔 했어. 내 책은 앞으로 그런 잘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많이 읽어서 드러내 줄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그러나 그 때에 이미 작가의 육신은 서서히 삭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 최명희는 한 번씩 통곡한다 하면 두 세 시간씩을 홀로 울었습니다. 그 긴 울음의 제의를 끝내고 나면 청암 부인의 넋이 씌우고 강실이의 넋이 씌우고 강모의 넋이 씌우는 것 같았습니다. 긴 울음 이후에 비로소 비처럼 눈처럼 내려오는 언어를 오롯이 받아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불을 쓰는 동안 그녀는 거의 눈물로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의 넋이 최명희의 파란 힘줄 오른 손을 잡고 최명희의 만년필로 하여금 자기들 사연을 구술하도록 했습니다. 구술 시킬 뿐 아니라 끝내 손을 내밀어 요구했습니다. 그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문학, 그건 참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소설의 무대가 된 남원의 혼불 마을을 찾아갑니다. 푸른 들길로 철로가 이어진 작은 <서도역>을 지나자 풍악산 날줄기에 매어 달린 것 같은 노봉 마을이 보입니다. 오십 년 전만 해도 밤이면 산을 건너가는 늑대 울음이 예사로이 들리곤 했다는 곳입니다. 소설 속에서처럼 슬픈 근친간의 사랑이 일어났을 법도 하게 50여 호의 마을은 겹겹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명희는 부친의 생가가 있던 이 곳을 무대로 벽화를 그린 장인처럼 손가락으로 바위를 파듯 소설을 써놓고 기진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서풍(서풍)이 광풍되어 몰아치고 소중한 것들이 덧없이 내몰리는 이 즉물적인 시대에서도 어딘가에서는 우리네 소중한 한국 혼의 불이 타오르고 또 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가버렸습니다. 고개 들어 풍악산을 바라보았을 때였습니다. 내 눈에 얼핏 마을을 휘돌아 떠나가는 혼불 하나를 본 듯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청암 부인의 것도 강모나 강실이의 것도 아닌 바로 최명희의 혼불이었습니다.
/김병종(한국화가·서울대 미대 교수)
/[김병종의 新화첩기행] <1> 혼불마을에서 중에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36 |
(남영희)'바른말 광'이 길어올린 영혼의 언어
최명희문학관
|
2023.03.17
|
추천 0
|
조회 365
|
최명희문학관 | 2023.03.17 | 0 | 365 |
| 135 |
(김두규)[풍수로 보는 전북 부흥의 길] <66> 전북의 풍수사(風水師)들 이야기(3)
최명희문학관
|
2023.03.02
|
추천 0
|
조회 434
|
최명희문학관 | 2023.03.02 | 0 | 434 |
| 134 |
(유화웅) 혼례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최명희문학관
|
2023.02.25
|
추천 0
|
조회 345
|
최명희문학관 | 2023.02.25 | 0 | 345 |
| 133 |
(이길재)[이길재의 겨레말]나랑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86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86 |
| 132 |
(이길재)[이길재의 겨레말]가을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401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401 |
| 131 |
(이길재)[이길재의 겨레말]날궂이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95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95 |
| 130 |
(이길재)[고장말] 먹고 잪다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38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38 |
| 129 |
(이길재)[고장말] 나어 집!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79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79 |
| 128 |
(이길재)[고장말] 삘건색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45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45 |
| 127 |
(이길재)[고장말] 허망헙디다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80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