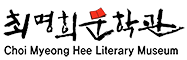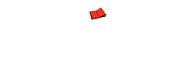나들목
그리고 최명희
최명희 씨를 생각함
최명희씨를 생각하면 작가의 어떤 근원적인 고독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1993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중국 연길 서시장을 구경하고 있다가 중국인 옷으로 변장하고 커다란 취재 노트를 든 최명희씨를 우연히 만났다.
「혼불」의 주인공의 행로를 따라 이제 막 거기까지 왔는데 며칠 후엔 심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연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너무 바가지를 씌우는 바람에 그런 옷을 입었노라고 했다. 그날 저녁 김학철 선생 댁엘 들르기로 되어 있어 같이 갔는데 깐깐한 선생께서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어찌나 통박을 주던지 민망해한 적이 있다. 그 후 서울에서 한 번 더 만났다. 한길사가 있던 신사동 어느 카페였는데 고저회와 함께 셋이서 이슥토록 맥주를 마신 것 같다. 밤이 늦어 방향이 같은 그와 함께 택시를 탔을 때였다. 도곡동 아파트가 가까워지자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울먹였다.’이형, 요즈음 내가 한 달에 얼마로 사는지 알아? 삼만 원이야, 삼만 원……


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모두 거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어?’ 고향 친구랍시고 겨우 내 손을 잡고 통곡하는 그를 달래느라 나는 그날 치른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몽땅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를 내게 했는지를. 그러자 그만 내 가슴도 마구 미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혼불’은 말하자면 그 하기 힘든 얘기의 긴 부분일 것이라고.
시집 ‘은빛 호각’ (이시형/창비) 중에서
▣ 작가 최명희와 소설 <혼불>을 떠올린 아름다운 분들의 애틋한 글이에요.
[식품저널] 화담산책 고향 말이 그립다
식품저널 2021년 12월 22일자
말은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수단인 동시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무언의 매체
신동화 명예교수의 살며 생각하며 (143)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느 장소에건 옆에서 귀에 익은 고향 말이 들리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바로 정감이 간다.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으로 돌아본다. 흔히들 비하하는 듯 사투리라고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문화와 사고의 바탕에는 고향의 말과 그 말이 품고 있는 비교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함축되어 있다.
대작 ‘혼불’을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쓰신 최명희 작가의 글에서 그 지역 토속어를 빼고 나면 작품의 깊은 뜻이 전달될까 생각해 본다. 한 단어, 단어에 배어 있는 그 말의 깊은 뜻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교육의 대중화로 표준말이 통용되고 모든 언론매체가 표준말을 사용하면서 고향 토속어는 점점 실체감을 잃어가고 더욱 초등학교에서부터 공인된 표준말을 가르치고 쓰도록 하니 각자 자기 내면에 갖고 있으면서 정신영역에 침투해있던 고향의 정이 깃든 말은 겨우 흔적만을 남기고 있다. 그것도 나이 먹은 특정 집단에만.
이런 현상은 세계 각국이 비슷하다. 영어권인 미국도 남부 말투와 북부가 다르며, 영국도 비슷하다. 한동안 유학할 때 스코틀랜드를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토속어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표준영어만을 배워왔던 나에게는 그냥 또 다른 외국어요, 전연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언어였다. 그분도 이런 향토 언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스러지고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호남지역에서 많이 쓰는 “그리여 잉” 이런 말을 글로 쓰면 같은 철자이나 음성의 표현수단인 말로 할 때 높낮이나 어감에 따라서 그 뜻은 긍정이나 부정으로 바뀌고, 때에 따라서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중간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말속에 함유된 또 다른 뜻은 과연 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향은 그 땅과 산천이 주는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감정이 있지만, 그 지역에 삶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말속에 또 다른 동질감을 느끼는 강력한 매체가 된다. 특히 고향이란 동지의식이 강한 군대에서는 말소리만 듣고 금방 고향 친구라는 것을 알고 반갑게 인사하고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대한다.
우리의 말은 이렇듯 내 생각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수단인 동시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무언의 매체가 되고 있다. 고향에서 산 기간보다 서울에서 산 세월이 더 길지만 내 말소리에는 지금도 고향의 채취가 남아있고 그 감정이 상대에게 전달된다. 택시를 탈 때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서로 고향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말의 억양과 독특한 끌림 등은 결코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다.
문학계에서는 지방토속어가 우리의 큰 언어자산이라는 말을 한다. 특정한 말은 그 말이 아니면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의 잊을 수 없는 말의 음색은 지금도 귓전에 들리는데, 어쩌다 수십 년 전 녹음된 말소리를 들으면 옆에 계시는 듯 따사롭다. 말로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맞지만, 그 말 속에 녹아있는 감정이 이입되기 때문이다.
감정을 실은 말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확실한 수단이다. 물론 동물도 소리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느낌을 같이하는 것 같지만 같이 공유할 수 없으니 이해의 한계를 넘어간다. 꾀꼬리의 아름다운 목소리, 봄날 높은 하늘에서 지저귀는 종달새의 울음은 어찌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 그냥 소리로 치부해 버리고 있다.
산책을 하다 보면 까치나 까마귀의 소리를 듣는다. 이 녀석들도 개개별로 목소리가 다름을 느낀다. 어느 까마귀는 까악까악 하는 대신 억억 하는 것 같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어미를 일찍 여위어 목소리를 배울 기회를 잃었다고 짐작하고 웃는다.
그렇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은 처음 부모에게서 배웠고, 특히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익혔을 것이다. 그래서 형제간 목소리는 비슷하다. 동생의 목소리는 전화로 들으면 내 목소리와 꼭 닮았다고 한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도 태어난 이후 배움으로 익힌 것이고, 어릴 때 습득한 그 소리는 장소가 바뀌어도 평생 바꾸지 못하나 보다. 그게 좋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36 |
(남영희)'바른말 광'이 길어올린 영혼의 언어
최명희문학관
|
2023.03.17
|
추천 0
|
조회 355
|
최명희문학관 | 2023.03.17 | 0 | 355 |
| 135 |
(김두규)[풍수로 보는 전북 부흥의 길] <66> 전북의 풍수사(風水師)들 이야기(3)
최명희문학관
|
2023.03.02
|
추천 0
|
조회 426
|
최명희문학관 | 2023.03.02 | 0 | 426 |
| 134 |
(유화웅) 혼례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최명희문학관
|
2023.02.25
|
추천 0
|
조회 338
|
최명희문학관 | 2023.02.25 | 0 | 338 |
| 133 |
(이길재)[이길재의 겨레말]나랑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76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76 |
| 132 |
(이길재)[이길재의 겨레말]가을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94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94 |
| 131 |
(이길재)[이길재의 겨레말]날궂이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85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85 |
| 130 |
(이길재)[고장말] 먹고 잪다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29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29 |
| 129 |
(이길재)[고장말] 나어 집!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68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68 |
| 128 |
(이길재)[고장말] 삘건색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34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34 |
| 127 |
(이길재)[고장말] 허망헙디다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추천 0
|
조회 372
|
최명희문학관 | 2023.02.09 | 0 | 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