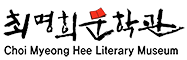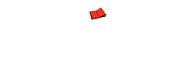나들목
그리고 최명희
최명희 씨를 생각함
최명희씨를 생각하면 작가의 어떤 근원적인 고독감 같은 것이 느껴진다. 1993년 여름이었을 것이다. 중국 연길 서시장을 구경하고 있다가 중국인 옷으로 변장하고 커다란 취재 노트를 든 최명희씨를 우연히 만났다.
「혼불」의 주인공의 행로를 따라 이제 막 거기까지 왔는데 며칠 후엔 심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연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고 너무 바가지를 씌우는 바람에 그런 옷을 입었노라고 했다. 그날 저녁 김학철 선생 댁엘 들르기로 되어 있어 같이 갔는데 깐깐한 선생께서 모르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어찌나 통박을 주던지 민망해한 적이 있다. 그 후 서울에서 한 번 더 만났다. 한길사가 있던 신사동 어느 카페였는데 고저회와 함께 셋이서 이슥토록 맥주를 마신 것 같다. 밤이 늦어 방향이 같은 그와 함께 택시를 탔을 때였다. 도곡동 아파트가 가까워지자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울먹였다.’이형, 요즈음 내가 한 달에 얼마로 사는지 알아? 삼만 원이야, 삼만 원……


동생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모두 거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어?’ 고향 친구랍시고 겨우 내 손을 잡고 통곡하는 그를 달래느라 나는 그날 치른 학생들의 기말고사 시험지를 몽땅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그가 얼마나 하기 힘든 얘기를 내게 했는지를. 그러자 그만 내 가슴도 마구 미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가만히 생각했다. ‘혼불’은 말하자면 그 하기 힘든 얘기의 긴 부분일 것이라고.
시집 ‘은빛 호각’ (이시형/창비) 중에서
▣ 작가 최명희와 소설 <혼불>을 떠올린 아름다운 분들의 애틋한 글이에요.
(김규남)김규남의 전라도 푸진 사투리 ‘맹이’와 ‘디끼’
오늘은 최명희의 소설 『혼불』에 나타난 용례들을 통해서 전라도 방언에서 무엇을 비유해서 말할 때 사용하는 통사적 장치 ‘맹이’와 ‘디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①사램이 옷을 입는디, 옷고룸이나 단초가 없으먼, 앞지락이 이렇게 벌어져 갖꼬 미친년이나 농판맹이로 요러고 안 댕기냐? 다 벗어지게. 그런 중도 모르고 헐레벌레 기양 댕기먼 어뜨케 되야? 꾀 벗제잉. 망신허고, 동지 섣달에 그러고 댕기먼 얼어 죽고, 그거이 먼 짓이겄냐. 옷고룸 짬매고, 단초 장구고, 앞지락 못 벌어지게 붙들어 걸어야제. 근디 그거이 쉽들 안헝 거이다. 니 인생 미친년 안 되고, 꾀 안 벗을라먼, 요 단초 한 개 수얼허게 보지 말어라. 이?”
시어미가 방물 가방 속에 든 앵두 단추 한 개를 며느리 서운이네의 저고리에 달아 주면서 여성으로서의 조신한 삶을 당부한다. 그이의 말을 듣고 보면 아니다 다를까 저고리 단추 하나의 상징성이 상당하다.
한편, 머리가 반백이 되어 가는 공배는 아직 성질 못 이기는 조카 춘복이의 행실이 못마땅해서 푸념조의 훈계를 쏟아내고, 팔팔한 춘복이가 그 혈기를 좀체 삭이지 못하자 훈계를 넘어 살기 냉랭한 경계의 말을 던진다.
②“너도 인자 나이 먹어 바라. 지 몸뗑이 건사허기도 힘들고, 처자권속 입으 풀칠도 해야고, 살든 자리서 곱게 죽어 갈라먼 그렇게 성질대로는 못 사는 거이다. 까딱 잘못허머언, 이만한 복쪼가리도 쪽박 뚜드러 깨디끼 지 발로 박살내고 마는 거여. 옛말에도 다 세 치 바닷을 조심허라고 안했능갑서.”
“모르겄소. 나도 늙어 꼬부라지먼 아재맹이로, 붙들이란 놈 오그려 앉혀 놓고, 참어라, 참어야능 거이여, 헐랑가 모르겄지마는, 아직은 셋바닥에 힘이 뻗쳐서 그렁갑소.”
“셋바닥이 칼날잉게 조심허그라. 니 목구녁 니가 찔른다.”
이 자리에서 새삼 『혼불』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논할 일은 아니나 이 소설은 백 년 남짓 전의 전라도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문학적 공간 속에 재현, 영원히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소설 속의 대화들 또한 지금도 여느 마을 고샅이나 ‘시암가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생생하다.
이 소설에서처럼 전라도식 말하기 방식 중에는, 통사적 장치 ‘맹이’와 ‘디끼’를 이용하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더 사실적으로 혹은 강조하기 위해 빗대어 말하는 방식이 널리 통용되어 왔다.
③ “하이고오, 신랑 좀 보소. 똑 꽃잎맹이네.”
“내동 암 말도 않고 소맹이로 일만 잘허드니. 무신 바램이 또 너를 헤젓는다냐.”
“무단시 비얌맹이로 그 방정맞은 셋바닥 조께 날룽거리지 말란 말이여.”
“너는 무신 노무 목청이 그렇게 때까치맹이로 땍땍땍땍 시끄럽냐아”
꽃잎 같은 신랑, 큰 마님 같은 신부, 소처럼 일 하던 춘복이, 뱀 혓바닥처럼 날름거리며 시답지 않은 말 많이 하는 짓, 때까치 소리만큼이나 시끄러운 말 등에서처럼 ‘맹이’는 신랑을 꽃잎에 비유해서 사내답지 않게 어여쁜 신랑을 기분 나쁘지 않게 놀려도 보게 하고, 시끄러운 말소리를 때까치 울음에 비유해서 소음의 상태와 심리적 거부감을 적절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맹이’는 의미상으로는 표준어 ‘같이, 처럼’에 대응하지만 그 형태가 판이하게 다르다. ‘맹이’는 아마도 ‘모양’에서 비롯하여 아주 오랜 세월을 거치며 그렇게 줄어들고 또 그 나름의 문법적 기능이 발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어떻든 ‘맹이’는 반드시 체언 즉 명사, 대명사 뒤에 와야만 한다.
④ 이 노무 신세는 머 생기는 것도 없이 참을 것만 산데미맹이로 첩첩허니…
“ 이 삭어 비어 부러서, 바람 들어 썩은 무시맹이로 씨커멓게 비치네요.
대가리 송곳맹이로 세우고 달라들어 자 놀랠 사람도 아니고,
쇠털맹이로 많은 날 다 두고, 훤헌 대낮 다 두고. 멋헐하고 의원을 부른대?
아금니 까악 물고 말도 장 안허고 장승맹이로 버티고 앉어만 있드니, 인자 웃소예?
엿가래맹이로 처붙어 있을 때는 언제고, 왜 가는 사람 찐드기맹이로 놓들 안히여?”
낯색 바꾸는 거이 꼭 비 오다 구름 개고 구름 쪘다 날 개는 것맹이여. 말짱 씻어 불제
‘맹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서 통사적 환경만 다른 것이 바로 ‘디끼’이다. 즉, ‘맹이’는 체언 즉 명사 뒤에 붙고 ‘디끼’는 용언 즉 동사 뒤에만 붙는다. ‘디끼’는 표준어 ‘듯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인데 아주 오래 전에 ‘듯기’이었던 것이 서로 다른 변화를 겪어 방언과 표준어로 나뉘게 된다. 비록 ‘듯이’와 ‘디끼’가 의미는 같으나 어감의 차이는 상당하며 더구나 표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언어적 장치로서는 맹맹한 어감을 가진 ‘듯이’보다야 팽팽하고 강렬한 어감을 갖는 ‘디끼’가 제격이다.
⑤ “씨? 씨가 머이간디? 일월성신이 한 자리 뫼야 앉어서 콩 개리고 팥 개리디끼 너는 양반 종자, 너는 쌍놈 종자, 소쿠리다가 갈러 놓간디? 그리 갖꼬는 땅 우에다가 모 붓는 거여?
“아 초례청으서 그렇게 사모 뿔따구를 기양 모래밭으 무시 뽑디끼 쑥, 뽑아 부러 갖꼬, 정 없단 표시를 딱 해 부렀는디 머.”
“아이고, 그러먼, 또 그 당대에 참말로 조리쌀 털어 내디끼 그 재산을 다 엎어 부렀으까요?”
“그러먼 기양 지름 조우 불 붙디끼 화악 번질거이그만. 소문이.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고, 그께잇 거 오래 걸리도 안헐 거이네.”
“소문만 익으먼 홍시감 꼭데기 빠지디끼 강실이는 톡 떨어지게 되야 있어. 자개 앞으로. 그러먼 줏어 오면 되잖여.”
표현 강화의 장치 ‘맹이’나 ‘디끼’를 사용할 때 세밀한 관찰과 정확한 비유가 있어야 한다. 즉, 평소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사물의 특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데다 적절한 발화 순간을 포착해야 하는 순발력까지 갖추어야 한다. 놀랍게도 이 지역 민초들의 경우는 그러한 언어적 순발력이 뛰어날 만큼 발달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라도가 판소리와 고대소설의 본향이 되는 데 있어 ‘맹이’와 ‘디끼’의 숨겨진 공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듯하다.
/문화저널 2005년 10월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26 |
(노인봉)의 작가 최명희의 모국어 사랑
최명희문학관
|
2007.09.16
|
추천 0
|
조회 2926
|
최명희문학관 | 2007.09.16 | 0 | 2926 |
| 25 |
(김택근)최명희와 ‘혼불’
최명희문학관
|
2007.05.25
|
추천 0
|
조회 2426
|
최명희문학관 | 2007.05.25 | 0 | 2426 |
| 24 |
[정성희] ‘교사 최명희’의 추억
최명희문학관
|
2007.05.25
|
추천 0
|
조회 2732
|
최명희문학관 | 2007.05.25 | 0 | 2732 |
| 23 |
(김규남)전라도 말의 '꽃심'
최명희문학관
|
2007.04.11
|
추천 0
|
조회 3741
|
최명희문학관 | 2007.04.11 | 0 | 3741 |
| 22 |
(박용찬) 한글 파괴하는 외래어… 스카이라운지 대신 '하늘쉼터'로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추천 0
|
조회 2320
|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0 | 2320 |
| 21 |
(이태영) 문학 작품과 방언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추천 0
|
조회 3158
|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0 | 3158 |
| 20 |
(김영석) 박정만 시인과 최명희...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추천 0
|
조회 2203
|
최명희문학관 | 2007.02.02 | 0 | 2203 |
| 19 |
(최병옥)혼불일기
문학관지기
|
2007.02.01
|
추천 0
|
조회 2365
|
문학관지기 | 2007.02.01 | 0 | 2365 |
| 18 |
(동아일보) [혼불 독자의 밤]그녀는 갔지만 '혼불'은 타오른다
최명희문학관
|
2007.02.01
|
추천 0
|
조회 1927
|
최명희문학관 | 2007.02.01 | 0 | 1927 |
| 17 |
(김두규)불꽃 같은 삶 ‘초롱불’ 안식처
최명희문학관
|
2007.02.01
|
추천 0
|
조회 2075
|
최명희문학관 | 2007.02.01 | 0 | 2075 |